영화가 방송드라마와 다른 점은 그 문법이 좀 더 복잡하다는 데 있지 않을까... 영화평론가는 있지만 드라마평론가는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고. 영화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더 많은 것이다. 그 더 복잡하다는 문법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선 '장르'가 아닐까 생각한다. 영화의 내적 분화라고 볼 수 있겠다.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자면, 액선, 스릴러, SF, 호러, 드라마, 슈퍼히로, 애니메이션, '에로' 등등. 장르에 대한 거라면 우리 드라마 쪽도 할 얘기가 있을 것이다: 불륜, 신분을 초월한 연애, 역사물, 정치물 등등. 하지만 영화 쪽 장르가 더 세분화되어있고, 장르에 대한 충성도도 더 높다. 왜 그럴까? 단순하다. 드라마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것이고, 혹은 적어도 그걸 전제하고서 만들고, 영화는 입장료를 내고서 영화를 볼 준비가 되어있는 관객층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다. 영화 역사가 길고 영화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지역의 관객일수록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딱히 제시할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긴 블로그아닌가). 코흘리개서부터 80대 할머니까지, 4천만이 보는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시작해도 심지어 몇 회를 빼먹었더라도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아닌게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대개 그렇다. 물론 영화에 대한 담론이 세분화되기 전에 영화도 그런 식으로 작동했고, 아직 그런 '전통'이 남아있기도 하다. 한국에서 수백만 심지어 천만 관객이 드는 영화는 대개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최근 상영되고 있는 '놈놈놈'은 깐느 버전이 아닌 한국용 버전이라는 얘길 들었다. 깐느 버전은 액션을 더 강조했고, 한국 버전은 줄거리를 좀 더 강조했다고 한다. 액션영화를 그것으로 즐길 수 있는 관객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몇 년 전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영화 '디워'도 CG나, 괴물/괴수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 정도로 혹평을 받아야 할 영화는 아닌데 뜬금없이 애국심 마케팅이 끼어들어서 오히려 더 이상한 영화로 만들어 버렸다. 허나 최근에는 한국 관객들 취향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수준이 높아졌다'고 표현은 좀 거북하고, 장르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한국에서는 앞으로는 감독이나 관객이나 더 장르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장르를 지키건 깨건, 그것을 중심으로 영화 커뮤니케이션이 프레이밍될 것 같다는 얘기다. 사실 '장르'에 대한 이해는 영화를 제대로 즐기는 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007 씨리즈를 보면서 왜 저리도 비현실적이냐는 핀잔을 던져서는 곤란하다. 007에서는 제임스 본드의 카리스마, 적성국 설정, 본드걸, 무기, 자동차 추격전 등 007영화 코드를 읽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
벼랑 위의 포뇨' (2008),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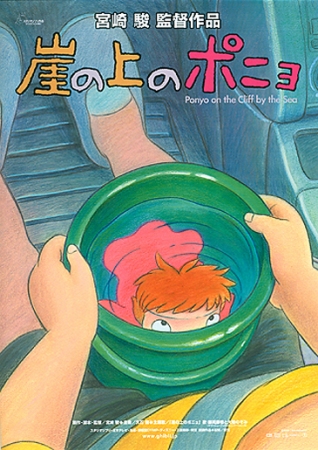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과 예비거장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다. '포뇨'는 감독의 전작에 비해서 줄거리가 빈약하기 그지 없어서 실망스러웠다. 진정한 아동용이었다. '구름의...' 는 그 양반 특유의 '잔잔함'이 너무 강해서 끝까지 볼 수 없었다. 그래도 언제가 두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림이 참 보기 좋았던 것이다. '포뇨'는 CG를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화면이라고 하고, '구름의...'에 대해선 다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세한 묘사가 뛰어나서 큰 화면으로 보고 싶었다.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난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다크 나이트'도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야 잘 감상할 수 있다. 이른 바 '슈퍼히로'물인데, 배트맨은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과는 다르게 매우 인간적인 인물(?)이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
다크 나이트'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전작 '
배트맨 비긴스' (2005)에서는 배트맨을 더 '인간화'시켰다. 이번 영화에서는 심지어 배트맨과 조커의 선악구도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이런 영화는 '슈퍼히로물'이라는 장르의 진화로 봐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다. '
핸콕'(2008, Peter Berg)도 전형적 '초딩용' 영화인데도, 그나마 인상에 남는 건 새로운 슈퍼히로상을 만들려 고 했다는 점. 세상에... 노숙자 슈퍼히로라니... 물론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라면 장르같은 문법을 모르는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고,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허나 그런 '명화'가 나오는 일은 참 드문 일 아닌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화의 문법으로 '감독'을 들 수 있을텐데, 그 얘긴 나중에... 어쨌든 난 드라마나 텔레비전을 멀리 하는 편인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려니와, 당장 먹기에는 좋은, 설탕 많이 넣은 음식 같아서 그렇기도 하다. 내 음식 취향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물론 티비프로그램도 찾아가며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않다. 대개 한 손에 리모콘을 들고 있거나, 적어도 손이 닿는 범위 안에 놓아 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부해야 하지만... 참, 놀기 위해서도 공부해야 하다니. 직업병인가... 근처 도시로 간단한 여행을 떠날 때도 그렇지 않은가. 대략 역사, 주요 건물 건축양식이라고 알고 가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직업병? 문화병? 문명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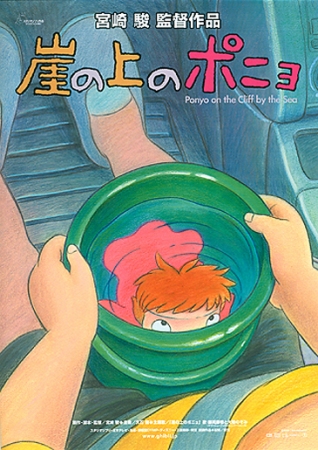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과 예비거장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다. '포뇨'는 감독의 전작에 비해서 줄거리가 빈약하기 그지 없어서 실망스러웠다. 진정한 아동용이었다. '구름의...' 는 그 양반 특유의 '잔잔함'이 너무 강해서 끝까지 볼 수 없었다. 그래도 언제가 두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림이 참 보기 좋았던 것이다. '포뇨'는 CG를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화면이라고 하고, '구름의...'에 대해선 다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세한 묘사가 뛰어나서 큰 화면으로 보고 싶었다.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난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다크 나이트'도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야 잘 감상할 수 있다. 이른 바 '슈퍼히로'물인데, 배트맨은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과는 다르게 매우 인간적인 인물(?)이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다크 나이트'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전작 '배트맨 비긴스' (2005)에서는 배트맨을 더 '인간화'시켰다. 이번 영화에서는 심지어 배트맨과 조커의 선악구도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과 예비거장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다. '포뇨'는 감독의 전작에 비해서 줄거리가 빈약하기 그지 없어서 실망스러웠다. 진정한 아동용이었다. '구름의...' 는 그 양반 특유의 '잔잔함'이 너무 강해서 끝까지 볼 수 없었다. 그래도 언제가 두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림이 참 보기 좋았던 것이다. '포뇨'는 CG를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화면이라고 하고, '구름의...'에 대해선 다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세한 묘사가 뛰어나서 큰 화면으로 보고 싶었다.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난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다크 나이트'도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야 잘 감상할 수 있다. 이른 바 '슈퍼히로'물인데, 배트맨은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과는 다르게 매우 인간적인 인물(?)이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다크 나이트'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전작 '배트맨 비긴스' (2005)에서는 배트맨을 더 '인간화'시켰다. 이번 영화에서는 심지어 배트맨과 조커의 선악구도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이런 영화는 '슈퍼히로물'이라는 장르의 진화로 봐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핸콕'(2008, Peter Berg)도 전형적 '초딩용' 영화인데도, 그나마 인상에 남는 건 새로운 슈퍼히로상을 만들려 고 했다는 점. 세상에... 노숙자 슈퍼히로라니... 물론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라면 장르같은 문법을 모르는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고,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허나 그런 '명화'가 나오는 일은 참 드문 일 아닌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화의 문법으로 '감독'을 들 수 있을텐데, 그 얘긴 나중에... 어쨌든 난 드라마나 텔레비전을 멀리 하는 편인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려니와, 당장 먹기에는 좋은, 설탕 많이 넣은 음식 같아서 그렇기도 하다. 내 음식 취향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물론 티비프로그램도 찾아가며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않다. 대개 한 손에 리모콘을 들고 있거나, 적어도 손이 닿는 범위 안에 놓아 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부해야 하지만... 참, 놀기 위해서도 공부해야 하다니. 직업병인가... 근처 도시로 간단한 여행을 떠날 때도 그렇지 않은가. 대략 역사, 주요 건물 건축양식이라고 알고 가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직업병? 문화병? 문명병?
이런 영화는 '슈퍼히로물'이라는 장르의 진화로 봐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핸콕'(2008, Peter Berg)도 전형적 '초딩용' 영화인데도, 그나마 인상에 남는 건 새로운 슈퍼히로상을 만들려 고 했다는 점. 세상에... 노숙자 슈퍼히로라니... 물론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라면 장르같은 문법을 모르는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고,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허나 그런 '명화'가 나오는 일은 참 드문 일 아닌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화의 문법으로 '감독'을 들 수 있을텐데, 그 얘긴 나중에... 어쨌든 난 드라마나 텔레비전을 멀리 하는 편인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려니와, 당장 먹기에는 좋은, 설탕 많이 넣은 음식 같아서 그렇기도 하다. 내 음식 취향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물론 티비프로그램도 찾아가며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않다. 대개 한 손에 리모콘을 들고 있거나, 적어도 손이 닿는 범위 안에 놓아 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부해야 하지만... 참, 놀기 위해서도 공부해야 하다니. 직업병인가... 근처 도시로 간단한 여행을 떠날 때도 그렇지 않은가. 대략 역사, 주요 건물 건축양식이라고 알고 가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직업병? 문화병? 문명병?
댓글 없음:
댓글 쓰기